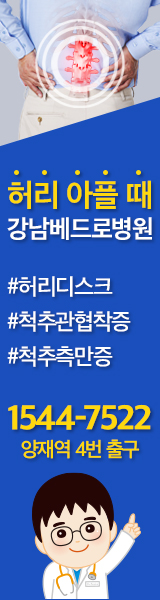오는 4일은 ‘강직성 척추염의 날’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매년 11월 첫 번째 금요일로 제정됐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 뻣뻣하게 굳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척추 외에 엉덩이, 무릎, 어깨 등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20세 전후의 젊은 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국내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만1106명으로 2016년 4만7명 대비 5년간 27.7%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다.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 요인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유전인자(HLA-B27, Human Leukocyte Antigen-B27)가 나타난다. 물론 HLA-B27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강직성척추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 면역반응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
증상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 통증이다. 초기에는 통증이 허리 아래쪽이나 엉덩이 부위에서 천천히 시작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뻣뻣한 ‘아침 강직’을 동반한다. 증상은 움직이면 호전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뻣뻣해진다. 통증은 증상이 생기고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엉덩이 양쪽에서 느껴지고, 특히 밤에 통증이 악화해 잠에서 깨는 경우가 흔하다.
강직성 척추염은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다른 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은 포도막염이고, 그 외에도 건선, 장 염증으로 인한 설사, 혈변,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김재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을 방치하면 주로 척추의 아래쪽에서 시작된 증상과 통증이 상부로 점차 진행되고, 결국 척추가 하나의 긴 뼈처럼 이어져 보이는 대나무 척추(bamboo spine), 즉 척추 변형과 강직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일상적으로 몸을 앞이나 옆으로 구부리거나 뒤쪽으로 젖히는 동작까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직성 척추염은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척추의 변형과 강직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허리 통증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허리가 아파도 단순 근육통이나 디스크, 생리통 등으로 오인해 병을 키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약물치료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일차적으로 사용되고, 여기에 반응이 없고 증상이 지속할 때는 종양괴사인자(TNF)-알파 억제제라는 생물학적 제제(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인플립시맙 등)로 치료한다. TNF-알파 억제제는 병의 원인이 되는 TNF-알파의 작용을 차단해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통증이 빠르게 호전되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도 가능하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운동을 반드시 병행한다. 운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절의 운동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꾸준한 스트레칭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된다.
김재민 교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난 뒤 허리의 뻣뻣함과 강직이 30분 이상 지속하고, 허리가 아파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반대로 움직일 때 통증이 서서히 사라진다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