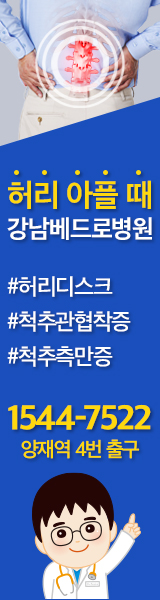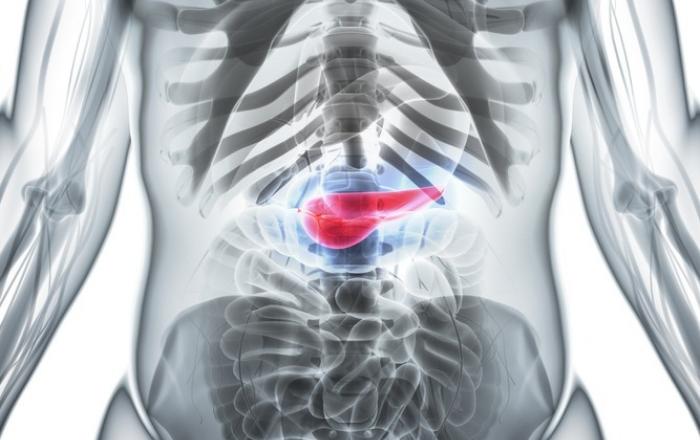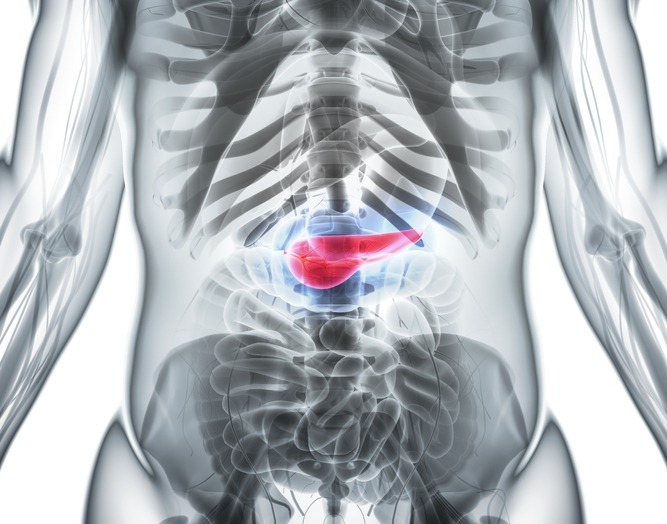
흔히 췌장암은 예고 없이 찾아와 손쓸 틈도 없이 생명을 뺏어가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췌장암을 결코 갑자기 발생하는 불행으로만 정의하지 않다. 우리 몸은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작은 변화와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그 힌트를 얼마나 예민하게 포착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췌장은 위장의 뒤편, 등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길고 납작한 장기다.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겉으로 만져지지 않으며, 소화를 돕는 효소를 생성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등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용한 성격’이 병이 생겼을 때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80% 이상이 췌장암의 전조 증상을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보이지 않고 느끼기 어렵다는 특성이 진단 시기를 늦추고 공포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비록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췌장암이 완전히 증상 없는 암은 아니다. 다만 그 증상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소화 불량이나 피로감과 비슷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울 뿐이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는 식사 후 상복부에 나타나는 통증이 등 쪽으로 뻗쳐나가는 감각이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식욕이 급감하는 경우,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이 진해지는 황달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단서는 ‘갑작스러운 당뇨의 발생’이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거나, 기존에 앓던 당뇨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된다면 이는 췌장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험 인자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0세 이상의 연령대, 흡연 습관, 당뇨병이나 만성 췌장염 병력, 그리고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췌장을 ‘남의 일’이 아닌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장기’로 인식해야 한다. 위험 요인을 가진 상태에서 몸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지체 없이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 의학 기술의 발전은 췌장암을 ‘불치병’의 영역에서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다. 과거에는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웠으나, 이제는 CT와 MRI는 물론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 아주 작은 종양까지 포착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혈액 속 암 DNA 조각을 분석하거나 단백질 패턴을 읽어내는 최첨단 조기 진단 기술들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치료 분야 역시 눈부시게 발전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먼저 줄이는 선행 치료, 정교한 로봇 수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중입자 치료, 그리고 환자의 유전적 특징에 맞춘 면역 항암 치료까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췌장암을 극복하는 힘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관심에서 나온다.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받는 실천이 필요하다. 췌장암은 분명 까다로운 상대지만, 우리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현대 의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는 질환이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영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