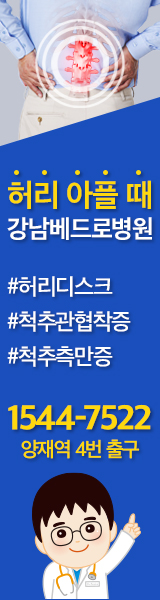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홍윤정 교수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다. 2011년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9월 21일인 이유는 이날이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World Alzheimer's Day)’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켐비’가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해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 6,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언어, 기억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후군이다. 치매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노인성 치매라고도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약 70% 차지), 뇌졸중(중풍)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과 동반된 치매가 있다.
보통 치매의 주요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를 떠올린다. 하지만 치매와 건망증은 차이가 있다. 건망증은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노화과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매의 증상은 아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점차 심해지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다. 기타 증상으로는 성격 변화와 감정의 변화, 우울증, 이상행동, 그리고 더 진행되면 신체적인 장애도 동반된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정밀검사로 실제 인지능력 저하여부를 진단한다. 이어서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액검사, MRI 등을 시행하여 원인을 발견하면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
치매 치료는 증상 조절·완화를 목표로 한다.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면 증상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치매 치료는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인지 재활 등 비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NMDA 수용체 길항제와 같은 약물로 환자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기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뇌기능 활성화를 위해 나이가 들어도 외국어, 악기연주 등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 게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두뇌활동이 도움이 된다.
평소 일기와 메모쓰기를 생활화 하는 것도 좋은 두뇌활동이다. 신체활동 역시 치매 예방에 좋다.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 확률이 약 80%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집안 일 등 비교적 가벼운 신체활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베이크레스트 센터 로트만 연구소 연구팀이 인지기능이 정상인 65세~85세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한 뇌스캔과 인지기능 테스트 결과, 식사 준비, 설거지, 정원 가꾸기, 집안 청소 같은 가벼운 신체활동이 많은 노인일수록 뇌의 학습, 기억 중추인 해마와 전두엽의 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조기진단과 약물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여러 약물들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평소 인지기능 변화를 잘 살피고 만약 의심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사·치료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