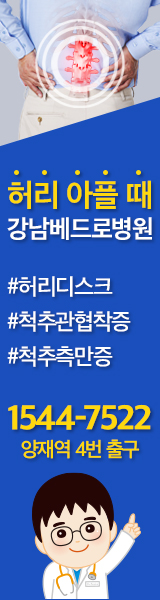프라더-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은 발달지연과 섭식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유전질환이다. 1956년 프라더(Prader), 레브라트(Labhart), 윌리(Willi)에 의해 처음 보고됐다.
이 질환은 먹어도 먹어도 억제되지 않는 식욕과 이로 인한 비만, 당뇨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출생아 1만~1만 5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진다.
주요 증상으로 작은 키와 비만, 과도한 식욕, 근긴장 저하증, 생식샘 저하증(hypogonadism), 지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증상은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출생 이후부터 2세까지는 근긴장 저하증과 빠는 힘 저하가 주로 나타나고, 2~6세에서는 근긴장 저하증과 발달지연이, 6~12세는 발달지연과 과도한 식욕, 비만 등의 증상을 보인다. 13세 이상에서는 지적장애(IQ 60~70)와 행동장애, 과도한 식욕, 비만, 생식샘 저하증 등이 나타난다. 또 사춘기가 늦거나 오지 않을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장대현 교수(의학유전·희귀질환센터장)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발달지연, 섭식장애, 다양한 내분비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라며 “먹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도비만을 동반한 저신장을 보인다면 프라더-윌리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15번 염색체의 미세결실로 나타나는 결손형이다. 원인의 60~70%를 차지한다. 다음은 이염색체성(Uniparental disomy, UPD), 즉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유전돼야 할 15번 염색체 모두 어머니로부터만 받은 경우(20~30%)다. 나머지는 드물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15번 염색체의 각인(imprinting) 센터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은 세 가지 유전적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DNA 메틸레이션(methylation) 분석법을 통해 99% 확진할 수 있다.
아쉽게도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치료법은 따로 없다. 다만 초기 중재를 통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조기진단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 성장호르몬 치료, 발달 재활 치료, 영양 상담이 필수적이고, 그 밖에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과도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식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하면 냉장고 등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아이들이 쉽게 음식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운동과 비타민 D 섭취가 추천된다.
장 교수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질환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생아기부터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받으면 정상 아이들과 큰 차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희귀질환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