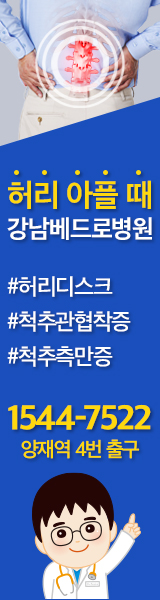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목 안의 나비’라 불리는 갑상선은 갑상선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목 안쪽에 위치한 갑상선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국내 갑상선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2020년 기준 56만 2천 명까지 증가했으며, 갑상선 항진증 환자 역시 해마다 10만 명당 40여 명 이상 늘고 있다. 환자마다 양상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갑상선호르몬 이상 분비로 인해 평소와 다른 증상을 겪기 쉽다는 것이다. 갑상선호르몬은 신진대사 및 체온 조절 등을 돕는 대표적인 내분비 호르몬인 만큼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감, 이상 체온, 심장 박동 변화 등의 눈에 띄는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무심코 넘기기 쉬운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소화기 계통 증상은 갑상선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강남베드로병원 갑상선센터 김규형 원장은 “소화기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 중 사실은 갑상선 기능 이상을 겪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병원에서 특별한 소화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한 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방치하면 2차 질환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대한갑상선학회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는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의 위험도가 각각 7.7배, 2.2배 크며,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4.4배, 골절은 4.8배 더 위험하다. 또한 저하증일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및 인지장애, 치매의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
기능저하증과 기능항진증의 원인 및 발생 연령대도 천차만별이지만 ‘면역체계의 오류’가 주된 이유다. 갑상선호르몬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이 주원인이며 20~40대에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보다 결핍되는 저하증은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에 의한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원인인 사례가 많으며 50~60대에서 발병 경향이 높다.
갑상선호르몬 이상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해 생활 속에서 겪는 신체의 ‘불편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항진증 모두 뚜렷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만큼, 평소와 다른 신체적 불편감이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진증은 주로 대사량 증가와 연관된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소화기 방면으로는 장 운동 증가로 인해 잦은 대변 혹은 설사가 일어나기 쉽다. 식욕이 늘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도 일어난다. ▲지나친 땀 분비 ▲피로감 증가 ▲맥박의 빨라짐 ▲체온 증가 ▲가려움증 ▲안구 돌출도 눈에 띄게 관찰된다. 반면 저하증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것은 물론, 증상이 심해지면 장이 움직이지 않아 장폐색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또한 ▲극심한 피로 ▲체온 저하 및 심한 추위 ▲피부 건조 ▲거친 머리카락과 탈모 증상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질환 모두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치료는 대부분 약물로 이뤄진다. 특히 항진증은 항갑상선제를 통한 약물 치료가 일반적이며, 이외 상태에 따라 갑상선 절제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를 복용해 갑상선을 파괴하는 치료도 이뤄질 수 있다.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법으로 치료하며, 이후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약의 복용량을 확인하게 된다.
‘평생 질환’으로 인식되는 갑상선 질환.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이른 시일 내 호전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