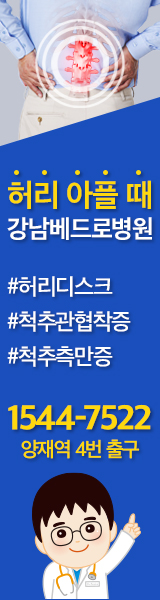도움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휴정 교수

그녀는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친한 친구를 잃었다. 사고 이후,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고장 난 라디오처럼 그날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과, 해야 했던 행동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사고가 난 지 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생존자의 죄책감(Survivor’s guilt)’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에 대한 속보를 보며 나는 진료실에서 만났던 그녀를 떠올렸다.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CPR(심폐소생술)을 하고도 죽음을 허망하게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대원들과 시민들, 그저 멍한 채로 얼어붙어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들도 그녀처럼 그날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과 해야 했던 행동들을 수없이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생존자의 죄책감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도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증상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자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구하지 못한 것을 지나치게 자책하기도 한다. 이러한 죄책감은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에 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 자살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심리 지원과 돌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생존자의 죄책감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평생을 괴롭히기도 한다. “왜 하필 거기에 갔나”, “철없이 놀다 죽은 것을 애도해야 하나”,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것인데”라는 등의 댓글은 벼랑 끝에 있는 생존자들을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내몬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선택을 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이 내 능력 밖의 일임을 절감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죽음 앞에 더 신중해지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고 불릴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누구나 살면서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죽음과 슬픔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자도생의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 곁에 진정으로 같이 서 있는 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감 어린 연대만이 우리를 살아남게 할 것이다. 살아남아 자책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곁에서 함께 있겠다고.”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