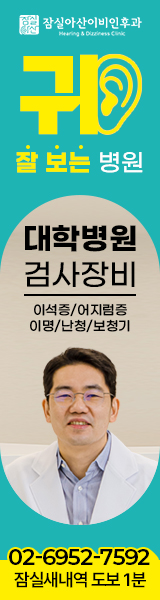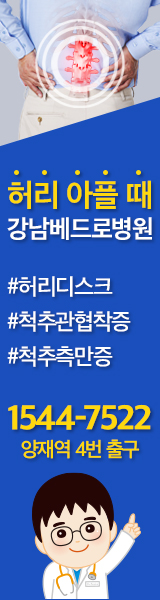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처지거나(안검하수), 사물이 겹쳐 보이는(복시) 현상이 잦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친다면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MG)’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는 신경이 근육에 움직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증근무력증은 몸의 면역체계가 정상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이다.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신경근육접합부)의 수용체가 자가항체의 공격을 받아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근육 약화가 발생한다.
국내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0~13명 정도로, 매년 약 2명 안팎의 새로운 환자가 진단되고 있으며 환자 수는 증가 추세이다. 주로 20~40대 여성과 50대 이후 남성에서 많이 발병한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이다. 병이 진행되면 얼굴, 목, 팔다리 근육이 약해져 말을 오래 하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구음장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고(연하곤란),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다.
특히 증상이 피로하면 악화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일중 변동’ 패턴을 보인다.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다른 신경·근육 질환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이 증상 악화 패턴 때문에 피로나 심리 문제로 오해해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로 자가항체를 확인하고, 반복신경자극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환자의 10~30%에서 흉선종(흉선에 생기는 종양)이 함께 발견될 수 있으므로, 흉부 CT 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흉선종이 발견되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다.
치료 목표는 ‘증상 조절’과 ‘부작용 최소화’이다. 증상 조절을 위해 피리도스티그민(Pyridostigmine)을 비롯해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하며, 약물 부작용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자가항체에 따른 맞춤형 치료 연구가 활발하며, 새로운 표적 면역치료제도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치료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중증근무력증은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환자는 감염,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더운 환경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부 항생제, 진정제, 마그네슘 제제 등 약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다른 진료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중증근무력증 환자임을 알려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질환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