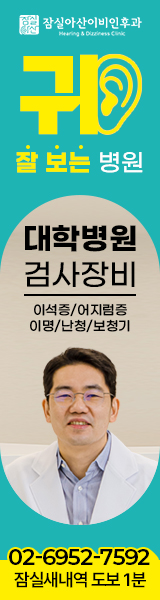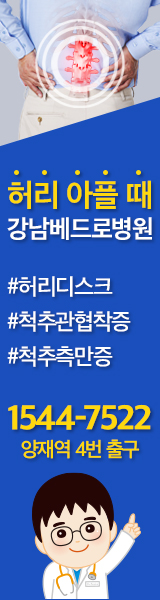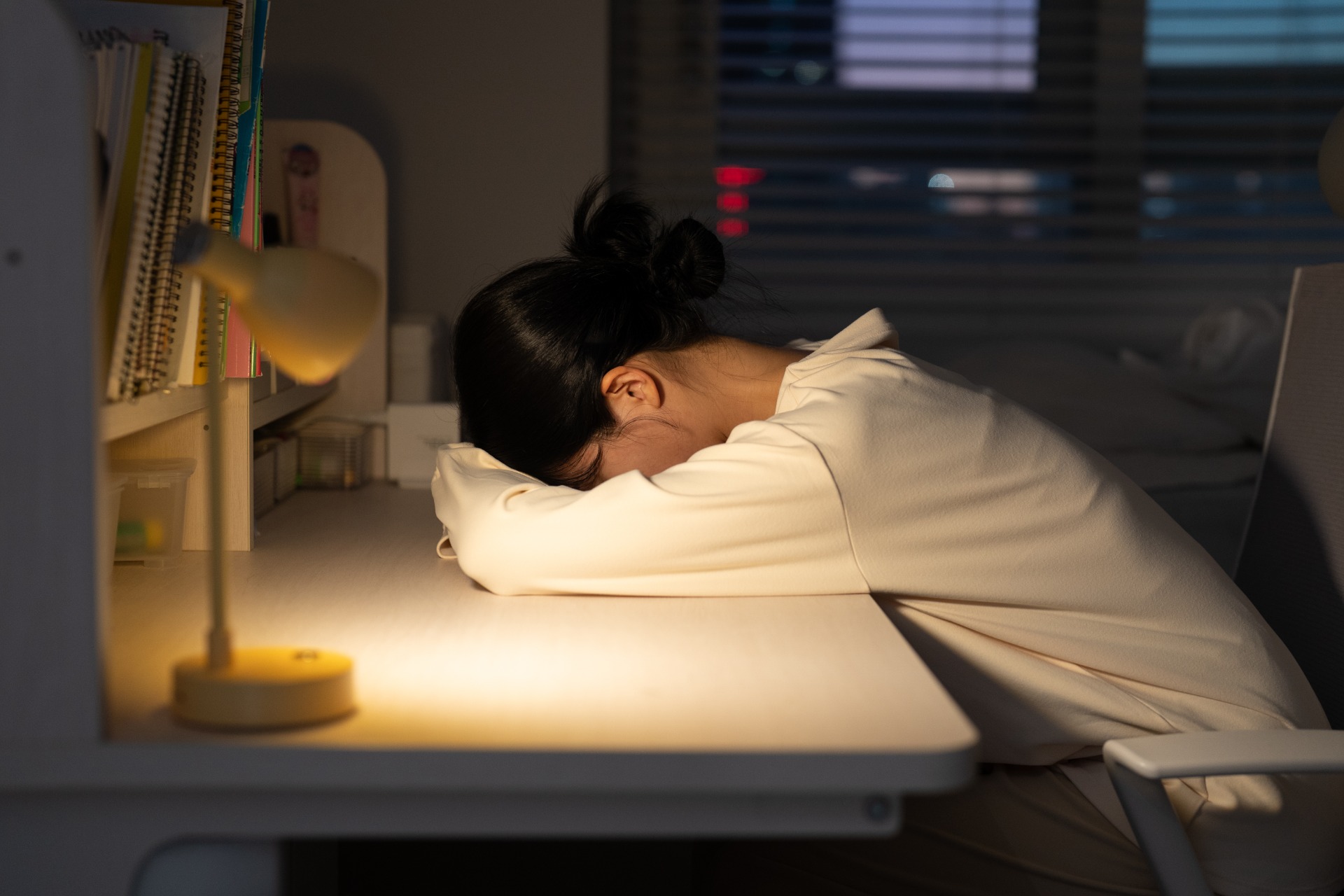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흔한 우울과 불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 명에서 2022년 약 100만 명으로 33%로 급증했으며, 불안장애 환자 역시 같은 기간 약 69만 명에서 약 87만 명으로 26% 증가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30대 청년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 20~30대 비율은 2018년 26%에서 2022년 36%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와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 단절, 활동 제약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더욱이 봄은 연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청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절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봄철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스프링 피크’라고 불린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는 일조량이 적고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우울감이 심화되고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계에서는 일조량 증가로 인한 생체 활력 증가와 함께 새 학기, 졸업, 인사이동 등 사회적 변화, 그리고 활기찬 봄을 만끽하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 역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더욱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울증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 심리치료, 그리고 뇌 국소자극기기를 이용한 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인 약물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조절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우울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이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쉽게 단정하기보다 지지와 격려를 통해 환자의 일상 복귀를 도와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지원할 정책이나 지원기관 연계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